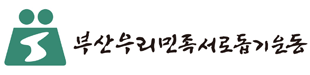[머니S리포트 - 韓 신재생에너지 운명은] ① 중국산 공세에 밸류체인 붕괴 우려 - 태양광 뜬다는데.. 웃지 못하는 韓 '신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3 09:21 조회1,045회관련링크
본문

태양광 뜬다는데.. 웃지 못하는 韓 '신재생에너지' 업계
이한듬 기자 입력 2022.07.13. 06:31[편집자주]국제유가 고공 행진과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경쟁력은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산 제품의 공세에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 국내 태양광·풍력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①태양광 뜬다는데… 웃지 못하는 韓 업계
②풍력발전 외산 바람 여전… 활로는?
③재생에너지 내실 키우려면
━
태양광 밸류체인은 업스트림-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으로 구분된다. 업스트림 부문은 소재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를 포함하고 미드스트림 부문은 태양전지(셀), 태양광 모듈(패널)이 있다. 다운스트림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시공·유지보수 시장으로 구성된다.
태양광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기업의 독점현상이 두드러진다. 독일 베른로이터 리서치에 따르면 업스트림 부문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폴리실리콘 63%, 잉곳 95%, 웨이퍼 97%에 달한다. 태양전지와 모듈 역시 중국이 전 세계의 79%, 71%를 장악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 보급된 중국산 모듈 점유율은 2019년 21.6%에서 2020년 35.8%로 증가했고 태양전지는 2020년 중국산 점유율이 70%에 육박했다.
국내 태양광업계는 중국의 공세에 밀려 침체 된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잉곳·웨이퍼 전문으로 생산하는 웅진에너지는 지속적인 업황 침체와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201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수 년 동안 매각을 시도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최근 법원에 회생 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던 한화솔루션은 지속 된 적자를 견디다 못해 2020년 사업 철수를 결정했고 OCI도 같은 해 국내 생산을 중단했다. LG전자도 태양광 패널 부문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30일부로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산업 분야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우려를 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는 보급 목표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축소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했던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이 20%대로 축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을 올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저렴한 전기요금을 통한 비용절감 및 풍부한 내수시장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분야 투자세액 공제 확대 및 해상풍력과 같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국산 사용 시 재생에너지증명(REC) 우대 등 내수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보고서에서 "전지 및 모듈에 제한된 국내 기업의 태양광 공급망 참여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및 규모의 경제로 원가 절감에 성공한 중국기업과 시장 내 경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태양광 공급망 중 업스트림을 배제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한 만큼 저단가 웨이퍼, 잉곳 제조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