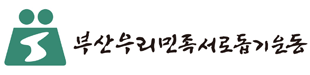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지난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4년3개월만에 열렸다.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회의 참석차 2년2개월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이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3국 협력 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이번 회의는 원만히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3국 장관 회의가 4년여만에 재개됐다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3국 정상회의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의 개최에 앞서 “3국 정상회의를 이른 시일 내 개최하는 것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 후 3국 장관은 대략적인 정상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준비를 가속화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결국 3국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희망했던 연내 개최가 어려워졌다. 한국과 중국 측 발표에도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이 조건을 만들고 관련 준비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발표에는 없는 ‘조건을 만든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조건’에 대해 “3국은 정상회의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중국 측 입장은 원칙적으로 정상회의 개최에는 동의하지만 원하는 조건이나 성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판은 깨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씁쓸한 장면은 또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3국 장관은 으레적으로 하던 공동 기자회견이나 만찬도 함께 하지 않았다. 왕 부장의 일정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이런 상황을 두고 중국이 한·미·일간에 틈을 벌리려고 이번 회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도 향후 한국과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틀 복원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한·중·일 3국 협력 틀의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회담 불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일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의나 결국은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의 대외관계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그만큼 뒤로 밀려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이게 한·중 관계의 현주소다. 현재 한·중 관계의 주도권 역시 중국이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방한을 희망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일각에서는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직접 대화할 필요성이 더더욱 없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대미 일변도 외교가 한·중 관계를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