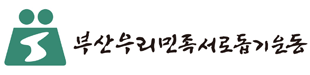윤 대통령 무기지원 언급 뒤…러, 즉각 반발
러·북 군사협력 확대시 한반도 긴장 고조
러·북 군사협력 확대시 한반도 긴장 고조

K-9 자주포 등에 쓰이는 155㎜ 포탄. 육군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의 경제·안보관계가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불가’란 정부 방침의 변화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한 물음에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 발언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지를 열어둔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살상무기 지원의 전제조건은, 보기에 따라선 이미 현실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서쪽 부차에서는 민간인들이 대규모 학살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러시아는 “조작”이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민간인 학살 등이) 이미 벌어진 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원이 가능하느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고려할 수 있느냐”고 묻자,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시에 민간인 피해는 상존하고 관련 상황 평가 자체가 유동적이라, 윤 대통령이 필요할 때 미국과 협의해 살상무기 지원을 할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어가면서 자국 포탄 재고량이 부족해지는 등 후속 군수 지원에 문제가 생기자, 한국에 동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과 유럽은 대규모 전면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군수업체를 통폐합한 탓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 생산량이 소모량에 견줘 턱없이 부족해졌다. 이와 달리 한국은 전시를 대비해서 단기간 내에 탄약 및 포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탄약공장을 국내에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대북 대비 태세 유지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고려해 무기 지원을 거절해왔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하자, 윤 대통령은 이튿날 출근길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경제 보복을 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을 돕고, 북한에 신형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쓴 글에서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새로 등장했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뒤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확대되면 한·미·일 안보협력과 충돌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다. 현대차, 엘지(LG)전자, 삼성전자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 기업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수조원대로 알려졌는데, 러시아가 보복에 나서면 이들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에,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온다. ‘군수품관리 훈령’을 보면 군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 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투 예비탄약을 비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