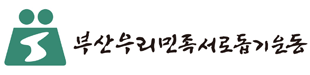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혼란
시장 잃은 중국산 밀려들라
‘우방국’ 러, 자동차에 관세
EU도 긴급 부과 검토 중

미국이 9일(현지시간) 중국에 84%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중국도 동률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이 관세를 두고 벌이는 ‘치킨게임’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가져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PB)에 따르면 9일 0시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84%의 추가 관세가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중 상호관세 34%를 예고하자 중국이 34% 보복 관세 방침을 천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세율을 50%포인트 더 올렸다. 지난 2월과 3월 중국에 부과한 기존 20% 관세를 합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중국에 물린 추가 관세는 총 104%다.
중국도 10일 낮 12시1분부터 모든 미국산 제품에 84%의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의 수출을 제한한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두 차례 10%씩 관세를 부과했을 때 농산물과 석탄, 대형 픽업트럭 등에 10~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미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인 대두류의 관세는 49%로 올라간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을 향한 일방적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미·중이 양보 없이 세율을 올리는 악순환은 글로벌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예로 들며 “관세가 100%를 넘더라도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입업체가 (중국) 공급업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전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가격은 미국산보다 20%, 유럽연합(EU)산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미국 내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가 거물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는 지난 7일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최근 관세는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이 크고 많은 이들이 경기침체 가능성을 더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져 투자자들이 주식과 금, 원유, 구리 등을 투매하면서 최근 미 금융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내림세를 보였다.
중국 역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의류, 가구, 신발 기업의 경우 총 관세율이 79%에 달할 수 있고 이는 대부분 업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수출업체들의 마진이 10~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관세율이 54%든 79%든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는 점엔)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알리바바, 쉬인, 테무 등 소액 소포장 판매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없앴고 추후 중국·홍콩발 소액 소포에 9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을 잃은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 산업을 초토화할 것이라는 공포감도 세계 각국에서 커지고 있다. FT는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에서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오는 7월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EU는 중국산 제품이 유럽에 밀려드는 걸 막고자 긴급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최근 자국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한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을 제외하고도 관세 보복전이 벌어지며 세계 무역질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중국은 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의 교역을 늘리며 관세 문제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9일 베이징에서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중앙주변공작회의 연설에서 “주변국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